오창익의 인권이야기
 > 인권연대세상읽기 > 오창익의 인권이야기
> 인권연대세상읽기 > 오창익의 인권이야기
광장에서 골목으로(경향신문, 2019.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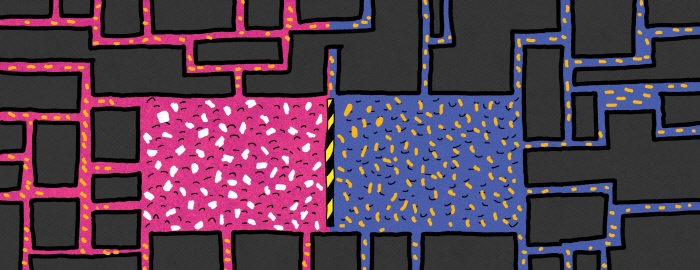
광장이 뜨겁다. 200만, 300만, 내친김에 500만을 부르기도 한다. 광장에서 벌어지는 세 대결은 뜨겁다.
광장은 둘 중의 하나로 갈라져 있다. 한쪽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꼭 지켜야 할 보배인 양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쪽에선 즉각 구속해야 할 범죄자로 치부하기도 한다.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구호들도 오간다. 한쪽에선 조국 장관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쪽에선 조국 장관을 지키지 못하면 문 대통령, 나아가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한다고 염려하고 있다.
광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지만, 각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광장은 배타적인 공간이 되기도 한다. 공정한 사회를 원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친북좌파라 규정하고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광화문은 닫혀 있다. 검찰개혁은 절실하지만, ‘조국 수호’에는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서초동은 닫힌 공간일 뿐이다.
대개 광장은 이랬다. 뜨거운 정치적 쟁점과 만나면 광장은 이례적인 공간이 된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광장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도, 또 보완하기도 했다. 위임해 준 권한을 함부로 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주권자들의 참여 공간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이상한 소굴이 되기도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계기로 광장은 어느덧 일상이 되었다. 공휴일마다 광화문이 뜨겁고 토요일마다 서초동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참석 규모로 민심의 향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숫자 대결로 결론이 날 싸움도 아니지만, 광장은 연일 타오른다.
광장이 일상이 되자, 일상은 골목으로 밀려났다. 태풍이 휩쓸고 난 직후여도 광장에는 사람들이 넘쳤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난리인데도 광장의 함성은 드높았다. 흔히 ‘민생’이라 불리던 숱한 현안들이 골목에 처박혀 버렸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그랬다. 민주노총이 한국도로공사 농성 현장에서 대의원대회를 열 만큼 중요한 노동현안이었지만,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였다. 여승무원들을 내쫓았던 코레일 이철 사장이 그랬듯, 사장만 결단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이강래 사장은 요지부동이었다. 1500명의 생존권이 걸렸고, 대법원 결정도 진즉에 났기에 법치주의 원칙까지 걸려있었지만,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그저 어두운 뒷골목을 배회할 뿐이었다.
광장의 싸움은 단호하고 치열하다. 상대는 간단하게 악마로 만들어버린다. 한참 싸움의 기세가 오르면, 사소한 비판마저 금지된다. ‘조국 수호’는 빼고 ‘검찰개혁’만 외치자는 목소리는 그저 ‘내부 총질’이거나 반동으로 여겨진다. 장관이나 대통령, 아니 민주주의란 제도까지 그 본질은 그저 도구일 뿐이다. 우리의 삶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싸움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만 닿아 있다.
싸움이 시작되면 원칙도 쉽게 훼손된다. 인권은 모두의 것이 아니라, 우리 편만의 것으로 쪼그라든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차이도 그렇다. 친정부 인사와 반정부 인사의 말은 극단적으로 갈리지만, 어제의 야당이 했던 말은 오늘의 야당이 하는 말과 꼭 닮아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데, 광장은 디테일쯤은 간단히 무시해버리기 일쑤다. 검찰개혁이 쟁점이 되었지만, 뭐가 검찰개혁인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검찰 특수부만 정돈하면 검찰개혁이 되는 걸까? 물론 그렇지 않다. 내부 부서를 다시 배치하는 게 개혁일 수는 없다. 악명 높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13년 박근혜 정권 초기에 없어졌지만, 검찰은 여태껏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정보기관의 이름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지만, 이름을 바꾸는 게 그저 요란한 눈속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검찰 특수부를 아예 없애버린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그래도 광장은 ‘검찰개혁’만 외친다. 원래 광장에서는 정교한 싸움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검찰 입장에선 개혁의 핵심이 특수부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끌어내고, 특수부를 줄이는 게 곧 검찰개혁이라는 구도만 만들면, 광장에 200만, 아니 3000만이 모여도 두렵지 않을 거다. 이 정도의 위기는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을 거다.
광장은 개인들이 만들어냈지만, 정작 개인은 소외되기도 한다. 그래서 최인훈은 그 유명한 작품의 제목을 <광장>이라 붙였는지도 모르겠다.
<광장>의 이명준은 결국 인도양 어디에선가 소멸하고 말았다. 남과 북, 둘 중의 하나만 강요하는 현실에서 이명준의 자리는 없었다. 이명준의 좌절은 곧 개인의 좌절이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어깨 겯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광장에 개인은 없다. 개인들이 모였으되, 개인은 없는 이 신묘한 판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광장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골목을 서성대는 개인의 자리는 더 좁아든다. 이명준은 그나마 최인훈을 만나 우리에게 화두라도 던져줄 수 있었지만, 최인훈마저 떠난 지금, 개인 곁에는 아무도 없다. 이 스산한 계절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마침,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꿈쩍도 안하던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과의 합의가 남았기에 반쪽 합의일 뿐이지만, 그래도 진전은 있었다. 이 진전을 이룬 것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였다. 주목할 만한 성과다. 정치가 자기 역할을 확인하고 모처럼 할 일을 했다. 하나의 모범이 되었다.
광장의 함성에 정치권이 화답해야 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는 국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중요한 매듭은 국회만이 풀 수 있다. 광장 문제를 풀고, 이제는 골목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게 정치의 본령이다.